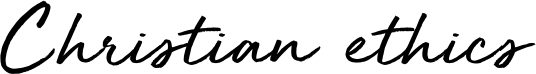눈 내리는 겨울이면 강천모설(江天暮雪)이란 시를 읊어본다. 고려 말기의 문인 이제현의 시이다. 제목은 ‘강가 마을에 내리는 저녁 눈’이라는 뜻이다.
바람 세고 구름 일그러지니(風緊雲容慘)
하늘 차갑고 눈발 세차네(天寒雪勢嚴)
한기를 체에 쳐 뿌리니 하얀 비단실 날리고(篩寒洒白弄纖)
집집마다 지붕에 소금을 쌓은듯 하구나(萬屋盡堆鹽)
먼 포구에 고깃배 돌아오고(遠浦回漁棹)
외딴 마을 주막 깃발 내리네(孤村落酒帘)
삼경에 눈 개이니 은색 달 빛을 시기한 듯(三更霽色妬銀蟾)
다시 눈 나려 성긴 발 걸리네(更約掛疏簾)
충선왕을 따라 원나라에 다녀 온 이제현이 북송의 소상팔경(瀟湘八景)의 영향을 받아 자기 나라 고려의 풍경을 그린 시로 보인다. 참으로 아름다운 시가 아닐 수 없다.
첫 연은 눈 내리기 전의 기상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갑자기 바람이 몰아치면서 구름의 모양이 일그러지더니 차가운 하늘에서 눈발이 세게 날린다. 3연은 가는 선이 되어 휘날리며 내리는 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느다란 비단 실처럼 내리는 눈은 누군가가 하늘의 찬 기운을 체에 쳐서 사방에 뿌리는 것 같아 보인다. 얼마나 정겨운 표현인가. 유학에서는 모든 것이 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으니, 하얀 눈 역시 보이지 않는 기의 변형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어느덧 눈이 쌓여 강촌의 지붕을 덮었다. 사람이 만든 모두 윤곽이 사라지고 온통 하얀 세상 속에서 눈에 덮여 있는 조그마한 강촌 마을은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보인다. 때는 저녁이어서 고깃배들이 포구로 돌아올 시간이다. 게다가 눈이 내리는 날씨 때문에라도 배들이 귀항을 서둘렀을 것이다. 노동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배들 역시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한다. 아마 주막집에는 깃발을 걸었던 모양이다. 요즘의 간판에 해당하는 표식일 게다. 저녁이 되어 깃발도 내려진다. 집에들 모여 가족이 저녁을 먹는 안식의 시간이다.
초저녁부터 내린 눈이 밤늦게 멈추었는 모양이다. 삼경이면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이니 매우 깊은 밤이다. 눈 내리는 밤을 두고 잘들 수 없어서 눈 소리 들으며 책을 읽고 있었을지 모른다. 문득 창밖이 갠듯하여 바깥에 나가보니 눈은 멈추고 달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한 밤중. 하얀 눈으로 덮인 세상을 비추는 은색의 달빛은 하얀 세상을 더욱 희게 만들고, 고요한 세상을 더욱 고요하게 만든다. 눈으로 덮였으니 사람의 흔적은 없어졌다. 무위로 내리는 하늘의 은총이다. 찬란한 고요, 고요한 찬란함.
그렇게 뜰에 서 있는데, 다시 눈이 내린다. 마치 고요한 빛, 빛나는 고요를 시기라도 하듯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발을 치듯이, 그렇게 성긴 발을 치듯이 다시 눈이 내린다. 두텁게 내리는 눈은 땅의 온기를 보존하고 보리싹을 보호하려는 거겠지. 세상의 흠을 덮고 차가운 아픔을 덮어 생기를 주려고 그렇게 밤새 내리는 거겠지.
지금 읽어도 강촌의 풍경이 눈에 선하다. 눈 내리는 저녁을 담담하게 묘사하는데, 아주 작은 문기(文氣)가 읽는 이를 천년 전 강가 마을로 끌어 들인다. 우리나라 자연주의 미학은 그림과 글에서 가능하면 인간의 수사를 줄이고 문기를 줄이려고 했다. 그래서 해석을 줄이고 자연풍광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고 했다.
물론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이미 해석일 수밖에 없다. 글을 쓰고 시를 짓는 것은 글의 대상을 통해 자신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말의 ‘글’과 ‘그리다’는 어원이 같으며, 글과 그림은 같은 것이다. 글도 그리는 것이고, 그림도 그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는 것은 그리워하는 것이다. 이 시를 읊으면 느끼게 되는 적막과 평화. 그것이 바로 시인이 그리워하는 것일 게다. 그리움을 담아 자연을 노래했으니 어찌 해석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문기를 줄인다는 것은 시의 저자가 독자의 해석을 주도하지 않고 저자가 묘사하려는 자연 자체가 해석을 주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진리를 자연에서 찾았으니, 언어를 통한 묘사의 대상인 자연이 해석을 주도한다는 것은 진리가 주도하는 힘에 이끌려 시를 읽고 감상하게 되는 것이다. 겸손하고 겸허한 종교적 감성의 해석학이 우리 조상들의 시에 들어 있다.
천년 전 문인 이제현이 그리워하는 것을 우리도 그리워 한다. 나도 같은 것을 그리워한다. 그렇게 저자와 독자가 천년의 세월을 넘어 하나가 된다. 종교적 시간관에는 현상학적 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현재를 중심으로 시간을 경험하며, 진리는 영원한 현재이다. 영원한 현재인 진리 안에서 천년 전의 시인과 나는 지금 현재 더불어 있다. 나는 지금도 한천모설을 읊노라면 내가 천 년 전으로 간듯하고, 옛 시인이 현재에 와 있는 듯하다.
시간은 눈처럼 주어진다. 눈 쌓인 새벽 마당에는 아무런 발자국이 없다. 지나간 발자국이 없다. 누구나 눈같은 시간 위에 자기 발자국을 새로이 만들게 된다. 그래서 눈처럼 오는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다. 그래서 시간은 흘러 가는 게 아니라 흘러 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은 은총이다. 가장 큰 은총은 내게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새해는 은총이다. 그리고 매일이 새해요 새 날이다.
사진. 삼척의 중경묘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