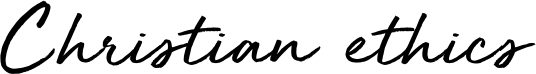어느새 벗꽃도 지고 한강 변 버느나무들이 연두색을 띠는 계절이 되었다.
학교에 있을 때인데 어느 해이던가. 김홍도의 그림을 컴퓨터 스크린에 띄어 놓고 보며 봄을 지낸 적이 있었다. 그림 제목은 마상청앵도(馬上聽鶯圖). 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조랑말 위에 앉아 있는 선비가 어딘가를 올려다 본다. 한 손은 고삐를 잡고 한 손은 부채를 들고 있다. 비탈길인듯, 말의 뒷다리는 약간 구부러져 있고 앞다리는 꼿꼿이 세워 수평을 이루고 있다. 말이 서 있는 곳은 길가의 버드나무 앞. 푸릇푸릇한 버느나무 가지 위에 꾀꼬리가 앉아 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듯, 선비는 길을 멈추고 나무 위를 올려다 보며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

찾아 온 봄을 환영하는 의식인가. 아니면 지나가는 봄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던 것일까.
여유롭기 이를 데 없다. 모든 것이 멈추어 있고 새소리만 들리는 듯하다. 느린 조랑말에 단출한 차림의 선비. 길라잡이로 나선 바지저고리 총각. 덩치가 크지도 않고 가지가 수려하지도 않은 조촐한 버드나무. 소리 없이 길가에 서서 오가는 길손을 맞이한다. 조용히 물이 올라 푸른 색을 띠는 나뭇잎. 흙냄새 나는 듯한 느긋한 삶의 리듬.
그리고 이제 그 느긋한 움직임마저 멈춘 듯하다. 시간이 멈춘 채 꾀꼬리 소리만 하늘에 울려 퍼진다. 보이지 않는 소리. 대기를 채운 새소리를 따라 선비는 하늘의 자비로움을 본다. 세상을 다시 생명으로 채워주는 하늘의 자비로움. 하늘의 마음에 닿으니 어느새 순간이 영원으로 열렸다.
생명을 주는 하늘의 자비야 말로 조선 선비들이 느꼈던 천명(天命)이었다. 살아라, 그리고 살게 해 주어라. 생명(生命)은 살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이 땅의 생명은 모두 천명에 충실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버드나무는 무의미를 모른다. 의미도 모르지만 무의미도 모른다. 그냥 산다. 사는 데에 충실하다. 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다. 그 생명의 힘들의 노래. 버느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꾀꼬리는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힘을 노래하고 있지 않은가.
그 소리는 틈 사이로 들리는 소리이다. 가던 발걸음을 멈추어야 들을 수 있는 소리이다. 우리 조상들이 조급함보다 느긋함을 좋아하고, 빡빡함보다 성긴 것을 좋아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가끔은 천명을 듣고, 대기에 가득찬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가끔은 그 하늘의 소리를 기준으로 일상을 수리하고 재정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조선 시대에 한강은 호수와 같았다. 굽이굽이 물이 흐르는데, 모래가 쌓여 유속이 느려지니 자연스레 잔잔한 호수로 보였다. 그래서 독서당과 압구정 사이를 흐르던 한강물을 가리켜 동호라고 했다. 동쪽 호수라는 뜻이다. 지금의 동호대교에 그 이름이 남아 있다. 그리고 난지도 앞에는 모래 톱이 길게 나와 있어 호수를 이루니 서호라고 했다. 한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중에 두 개의 큰 호수를 만드니, 곧 동호와 서호이다. 남산 위에 달이라도 뜨면 잔잔한 한강 위에 달빛이 비추고, 선비들은 배 띄우고 시를 지었다.

겸재 정선의 <금성평사>라는 제목의 그림이다. 평사는 모래벌이라는 뜻이고, 금성은 금성당이라는 절이 있는 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왼쪽의 맨 앞의 산이 금성산이다. 오늘날의 성산동에 금성산의 이름이 남아 있다. 수많은 모래톱들이 금성산 강변 마을 앞쪽으로 삐죽이 나와있고, 그 중에는 강 중앙에까지 뻗친 것도 있다.
250여년 전에 정선이 그린 후에, 이곳 지형이 나중에 하나의 섬을 이루면서 난지도라고 불리는데, 오늘날의 서울시 상암동과 고양시 덕은동 지역이다. 난초가 많아 난지도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가장 왼쪽의 산이 남산이고 금성산 뒤의 산이 마포지역의 와우산이다. 오른편으로는 선유봉이 보이고, 겸재가 현감으로 있던 양천현의 강가 모습이 보인다.
길게 뻗은 모래톱 주변에 배들이 떠 있고, 때는 늦은 봄인지 버드나무가 많이 푸르러져 있다. 김홍도의 마상청앵도보다 수십년 앞선 겸재의 그림 역시 여유로운 자연의 풍광을 후대에 전하고 있다.
이런 느긋함의 자연주의 미학을 지녔으니 조선은 서구식의 산업화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기계적 노동이 도입되고, 한강도 개발되어 유원지가 생기고 모래톱은 건설재로 파가고, 유속도 빨라지고 호수는 사라졌다. 동호 위에 뜨던 달은 사라지고 유람선이 오가며, 서호의 물고기 소리는 강변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소리로 바뀌었다.
산업화도 해야되겠지만, 시간을 넘어 영원에 가 닿는 틈새도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부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생명 자체에서 하늘의 풍요를 보는 자연주의 영성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김홍도의 마상청애도를 보며 꾀꼬리 소리를 듣자니, 멀리 보이는 한강이 호수가 되어 남산 위의 달을 비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