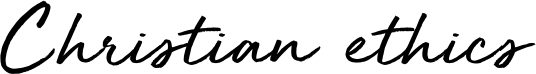“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음이 없다.”(무위이무불위. 無爲而無不爲)
이 말은 노장의 도교에서 즐겨 쓰는 말이고, 유교에서도 곧잘 사용하는 숙어이다. 유교와 도교 뿐 아니라 불교에서도 쓰는 말이다. 기독교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신앙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다. 종교마다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구원의 경지를 나타내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무위이무불위”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필요한 일을 다 한다는 뜻이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진리가 나를 움직여 일할 때의 사태를 묘사하는 말이다. 주도권을 진리에게 넘겨주고 나는 수동적으로 진리의 움직임에 이끌린다. 그 때에 내가 마음먹고 무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상황마다 알맞고 옳은 일이 내게서 저절로 이루어진다. 무얼 해야 한다는 당위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일이 내게서 이루어진다. 상황과 대상을 하나하나 따로 대하지 않고 통일된 상태에서 평등하게 하나로 관통한다는 점에서 거침이 없고, 거침이 없는데 늘 일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니 가장 자유로우면서도 능력이 충만한 경지이다.
노장의 도교에서는 이 말을 자연주의적 시각에서 사용했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이라는 말이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몸은 자연의 일부요, 자연의 원리를 따를 때에 가장 건강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몸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몸이 요구하는 것을 넘어 과잉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몸을 벗어난 마음이 건강을 해치고 과욕으로 남과 갈등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과 사회의 건강을 되찾으려면 각자 마음을 몸과 하나 되게 해서 몸의 리듬에 충실하면 된다.
수양을 할 필요가 없다. 도덕적이기 위해서 욕망을 누르거나 남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무욕의 세계로 갈 필요가 없고 적당한 욕망이면 된다. 그냥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몸의 요구를 따르면 된다. 특별히 도덕적이기 위해 애쓰지 않고 몸의 자연스런 생리적 흐름을 따르면 되니, 무위자연이다. 그렇게 할 때에 과욕이 사라지고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니, 무위(無爲)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다(無不爲).
유교에서 볼 때에 도교는 너무 낙관적이다. 사람의 마음은 이미 몸의 자연스런 요구에 잘 따를 수 없도록 많이 어긋나 있다. 지금의 자연스러운 마음 씀씀이는 잘못된 습관으로 오염된 부분이 크다. 그러므로 자기를 이기는 마음의 훈련과 수양이 필요하다. 마음의 훈련을 위해서는 몸가짐도 바르게 해야 한다. 우리 몸도 이미 과잉된 마음의 지배를 받아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몸과 마음의 훈련을 통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덕을 쌓아야 한다.
모든 상황에 맞는 자유롭고 조화로운 행동거지는 수양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이다. 『중용』에서는 “조화라는 것은 천지가 도달해야할 도”(和也者 天下之達道也)라고 했다. 조화는 이미 이루어져 있지만 이루어야할 과제이다. 퇴계 선생은 이발(理發)을 말했는데, 이발이란 이가 발하고 기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理發而氣隨之). 하늘의 천리가 나를 이끌고 나는 하늘 진리에 이끌린다. 그때에는 모든 일에 어긋남이 없고 남들과도 조화를 이룬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한다. 그래서 되지 않는 일이 없으니,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이다.
유교에서는 무위라는 말을 특별히 왕도 정치와 관련해서 말했다. 이른바 무위의 정치(無爲之治)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순 임금을 가리켜 “무얼 하지 않고도 다스렸다”(無爲而治)고 말했다. 덕으로 통치할 때에 만물이 자연스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조화와 질서가 이루어짐을 가리킨다. “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있으매 뭇 별들이 모두 북극성을 향하는 것과 같다.”(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 )
주희는 이 구절을 풀면서 “덕으로 정치하면 가만히 있어도 천하가 그리로 돌아온다.”(爲政以德 則無爲而天下歸之)고 말했다.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어 무위이지만, 뭇 별들의 움직임의 중심축이 되어 조화로운 움직임을 주장한다. 그렇듯이 국가의 중심에 덕 있는 왕이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세상은 조화로운 질서 속에서 사로 도우며 잘 돌아간다. 유교에서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가 덕 있는 군주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세상을 가리킨다.
대승불교에서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전진의 혜원이 열반의 경지를 가리켜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로 표현했다. 열반이란 완전히 깨달은 자가 되어서 부처가 된(成佛) 경지이다. 그것은 내 안의 영 곧 불성(佛性)이 모든 현상의 근원이 되는 우주적 본체 곧 진여(眞如)와 합일된 경지이다. 그때에는 내가 하는 일이 없고 법성본체(法性本體)가 내게 현현하여 일한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업보를 벗어나 석가모니처럼 법신(法身)이 되니 선과 악, 생과 사 등의 모든 분별을 벗어나 물아일체가 된다. 만물이 연기의 결과이니 자기라고 할 만한 것(自性)이 없고, 나 역시 무아가 된다. 열반과 무아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에 해당하는 구절이 성서에도 많은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다. 삶을 살아가고 행동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끄는 대로 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가리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죄와의 싸움을 내가 이겨낼 수 없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같이 한 마음으로 짓는 죄를 가리킨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가리키니 곧 구조 악이다.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방식 속에 죄가 있다. 말하자면 어떤 거대한 죄의 힘이 국가와 사회를 움직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을 죄의 노예로 만든다. 개인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깨우쳐 알아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당화되거나 미화된 증오와 폭력이 삶의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늘 혼란과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독교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말한다. 세상 한 가운데에서 우리처럼 세상을 겪으면서 우리가 당하는 세상의 죄 곧 증오와 폭력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어린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내 놓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므로, 그 분의 고난은 우리 모두의 고난을 흡수한 것이요, 동시에 세상 죄를 이김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이긴다.
그러므로 죄와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가 하신다. 나는 나를 위해 세상 죄와 싸우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에 믿음으로 참여한다. 성령의 역사로 나는 세상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다. 그렇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고 절규했다. 나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죄인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는 해방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삶의 주권을 내어드릴지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속에서 내 마음과 몸은 가벼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 그때에 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무위이무불위이다.
그러나 무위이무불위는 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무위이무불위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죄 지을 수 없는 자유”라고 표현한 상태이다. 그 경지는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질 일이다.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이 아니라, 나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다. 그 점에서 기독교는 도교나 유교나 불교와 다르다. 불교에서는 내 안의 여래장(如來藏)과 불성이 법성본체와 본래 하나임을 말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내 안의 하나님 곧 성령은 불성과는 달리 절대 타자이다. 그 점이 불교의 여래장 사상과 다르고, 유교의 이기론과도 다르다.
무위이부불위라는 자유의 경지는 유교에서는 ‘참 사람’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 참 사람이란 사람 됨됨이의 완성을 가리키는데, 타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개인 윤리적 개념이다. 유교의 사회윤리는 개인윤리의 연장에서 이루어진다.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말하는 불교에서는 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참 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사회의 평가를 받는 사람 됨됨이와 관계없으니, 윤리나 도덕적 선악과는 다른 차원이다. 불교에서 사회윤리는 이차적이고 부수적이며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도교에서 무위이무불위는 자연인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
기독교는 나의 죄보다는 세상의 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구조 악을 제거하는 사회 윤리적이고 사회변혁적인 측면이 강하다. 불교는 본래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초점이 있고,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 곧 좋은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다. 불교는 내향적이고 정치철학이 부재할 수 있으며, 기독교는 외향적이며 각자 내면의 자기성찰이 부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