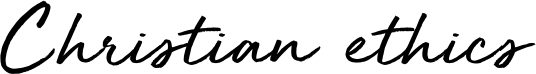마가복음에는 첫 장부터 예수께서 병 고친 얘기가 나온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내쫓고 병 들려 고생하는 이들을 낫게 해 주신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얘기가 나온다.
과거에 나병은 죽을병으로 인식되었다. 살이 썩어서 몸이 변형되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나병을 무서운 병으로 인식한 까닭은 나병을 전염병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나병에 걸리면 혼자 죽을 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병환자들은 격리되었다. 그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무덤 주변에 거하거나 따로 굴속에 모여 살았다.
복음서에는 무덤에서 사는 거라사의 귀신들린 자 얘기가 나오는데, 무덤에서 산다는 것은 마을로부터 추방된 자임을 의미한다. 고대사회에서 추방은 죽음을 의미한다. 희생제물은 대개 죽여서 피를 뿌렸는데, 숫염소를 광야로 내쫓는 방식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는 경우도 구약성서에 나온다. 그리스 비극에서도 추방은 사형과 같은 처벌로 사용된다. 공동체로부터의 추방은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고, 일종의 종교적 저주와 같은 것이었다. 무덤이나 동굴에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나병환자들은 추방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었다.
혹시 길 가다가 마을 사람과 부딪히면 나병 환자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밝혀야 했다. “나는 부정한 자요, 나는 부정한 자요.” 큰 소리로 몇 번 외쳐서 다른 이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부정 타는 것이었다. 부정이라는 말 자체는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니 ‘더러운 자’라는 뜻이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 사람이 더러워지면 부정타게 되고, 부정함은 하늘의 노여움을 불러들여 재앙을 몰고온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자 역시 부정하게 된다. 부정타서 재앙을 당하지 않으려면 부정한 자를 멀리 두어야 했다. 나병이라는 병을 부정한 자에게 내린 하늘의 저주로 보았고, 자칫 잘못하면 접촉으로 인해 마을 전체에 재앙이 임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병환자를 추방하거나 격리해서 따로 살게 했던 것이다.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려면 숲을 통과해야 했는데, 숲 속 후미진 곳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얘기가 우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 나병 환자가 아이들을 잡아서 간을 꺼내 먹는다는 얘기였다. 성경 시대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을 의학적 관점에 보지 않고 종교의 관점에서 보아, 아이들이 부정한 존재를 멀리 하도록 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처럼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왔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1:40)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낫게 해 주셨다.
설교자에 의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교회라는 곳. 그곳이 성소요, 거룩한 곳이다. 이천년 동안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곳으로서 교회는 성소이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듣는다. 평소에 사느라고 바빠서 잊혀진 사람들.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병자를 공동체로부터 내 쫓는 세상.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소수를 배제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교인들도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교인들은 주일에 교회에 와서 나병 환자의 얘기를 듣는다. 교인이라고 더 착하거나 더 도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에 모여 자기들이 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 잊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성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나병 환자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원수는 대립하고 있는 자이지만 부정한 자는 아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는 누구와 대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와 분리의 관계에 있다. 그들은 사회의 보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고 분리된 자들이다. 사람들은 나병환자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부정탄 그들을 끔찍해하고 배제해서 잊을 뿐이다.
그들이 다시 무대에 등장한다. 잊혀진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공공의 공간, 그곳이 교회이다. 복음서는 나병환자가 종교법을 어기고 예수께 다가갔다고 말하며, 예수께서 그를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 주셨음을 전한다. 예수께서 종교법을 어기고 나병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다. 그를 받아주신 것이다.
모두로부터 배제되었던 슬픈 자가 받아들여졌다. 세상에 의해 분리되었던 자를 받아주신 분. 그 분은 세상과 다른 또 하나의 세상,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다. 성서는 나병환자가 제사장에게로 가서 깨끗해 진 몸을 증명했다고 전한다(마가 1:44). 그것은 사회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예수께 받아들여진 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 말씀이 낭독되고 선포되면서, 분리되어 배제된 자를 불러내는 작업이 교회를 채운다. 공명되어 교회 천장을 때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듯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인들은 잊혀진 자들을 기억한다. 잊어버리고 싶어서 사람들에 의해 잊혀진 자들이 사람들 모인 곳으로 다시 복귀한다. 그곳이 교회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소이고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이사야 65:17).
새 하늘은 새로운 종교를 의미한다. 희생양의 피를 바치는 종교가 아니다. 누군가를 또는 어떤 집단을 희생양 삼는 세상을 묵인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고하게 희생된 자들을 희생시킨 자들 앞으로 다시 불러내는 종교이다.
새 땅은 새 세상을 말한다. 분리된 사람들을 기억하여 공동체로 복귀시키는 사회, 그리하여 사람차별을 극복해 나가는 세상이다. 교회는 나병환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으로서 새로운 종교가 선포되는 곳이고, 새 세상이 시작되는 곳이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한편, 교회라는 공공의 공간에서 들려지는 나병환자의 이야기는 각자의 마음이라는 내면의 공간에서도 울려 퍼진다. 나병환자 이야기는 교인들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교인들은 처음에 나병환자를 생각하다가, 점차 자기 얘기로 알아듣는다. 불쌍한 나병환자는 자기 자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소외된 자다. 성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자기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결국 사회 속에서 서로를 소외시키며 산다. 배제와 소외는 나병환자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곳 어디에서나 벌어지는 이야기이다. 사람은 누구나 배제된 존재요, 소외된 존재이다.
그러므로 예수께 받아들여진 나병환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기 자신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인가.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진 자는 자기 소외를 이기고 자기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자기에게 받아들여진 자는 남들에게도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그렇게 남들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실존적 차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교회는 사회적 차원 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곳이요, 그래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