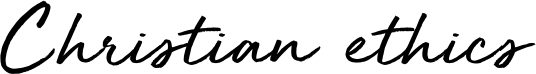겸재 정선은 65세에 양천현령에 부임했는데, 영조임금이 한강 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덕분에 한국인들은 18세기 중반 한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겸재의 진경산수화는 이상향을 그린 정형산수화와 달리 조선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린 것이므로, 근대화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경치를 알 수 있다.
그때에는 지금보다 사람도 훨씬 적고, 삶의 리듬도 훨씬 느렸다. 교통수단이라야 대지를 딛고 걷는 두 발 외에는 별로 없었으니, 인간의 몸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수단이면서 동시에 교통수단이었던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는 배를 사용했으며, 양반들은 종종 나귀를 타고 이동했다. 그러나 배도 바람의 힘으로 가는 돛단배요, 나귀는 말과도 달라서 느리게 걷는다. 모터를 달고 달리는 오늘날의 교통수단에 비하면 한없이 느렸다. 생산과 소비도 느리게 진행되었으니, 농사는 심어서 거둘 때까지 일 년 가까이 걸리고, 임금도 월급이 아니라 추수 때가 되어 받는 것이니 소비 역시 느릴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때그때 쓰고 버리는 것은 거의 없이 한번 사면 몇 년은 쓰는 내구성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철학으로도 유학이나 불교나 조급해 하는 것을 경시했으니, 그 어느 것도 빠른 것이 없으며,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느렸다. 그만큼 삶에 변화가 없었던 셈인데, 변화가 없다고 삶이 지루하고 단조로웠던 것은 아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때에 가난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지루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아침에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며,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벌레가 우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순간순간 새로운 감흥을 느낀다면 단조로운 삶과도 거리가 멀다.
오히려 지루함이란 현대문명의 산물이니,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나오지만 소비를 통해 단조로움을 물릴 수는 없는 노릇이요, 아파트 값이 매일 올라도 사실상 새로운 게 없는 삶을 살아간다.
느리게 흘러갔던 삶의 리듬은 겸재의 행호관어(杏湖觀漁)라는 작품에서도 볼 수 있으니, 행호관어란 ’행주산성 앞의 호수 같은 한강물에서 고기 잡는 배들을 보다’는 뜻이다. 행주산성이라고 불리는 덕양산 끝자락에 있는 별장들과 그 앞의 강변 쪽의 버드나무들이 한가롭다. 강물에 떠 있는 배들은 고기잡이 배들인데, 해마다 봄이 되면 서해에서 올라오는 웅어와 황복을 잡아 임금께 진상했다고 한다. 지금도 이곳 주변에는 웅어회를 파는 곳들이 있는데, 이곳 한강물에서 잡는 건지 임진강 쪽에서 잡아 오는 건지 알 수 없다. 물의 맑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요즘에는 이곳에서 웅어 보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강서지구 한강공원에서 바라본 한강은 여전히 큰 호수처럼 보인다. 삼백년 전과 달리 강 중앙까지 뻗은 모래톱이 보이지 않으니, 과거보다 유속은 훨씬 빨라졌을 것이다. 양천관아가 있던 강변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지나고 있어서 자동차 소리도 요란하다. 물도 빠르고 자동차도 빠르게 달리니 행호라고 부르며 한강을 호수로 여겼던 과거의 감흥을 느끼지 못할 법도 하다.
그러나 아랫물이 빠를지 모르나 위에서 보기에는 물이 잔잔하다. 인적이 없는 곳에서 홀로 바라보고 있으니 맑은 물이 가득 찬 호수와 같다. 버드나무에 붙어서 내 귀에 대고 떼 지어 울어대는 늦여름의 매미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자동차 달리는 소음도 묻혀버린다. 그리하여 겸재의 시간으로 돌아온 듯하니, 겸재가 바라보던 삼각산이 지금도 그 자리에서 멀리 보이고, 행주산성이 있는 덕양산도 그대로 서 있다. 고기잡이 배 대신에 오리 가족 한 떼가 잔잔한 물결을 타고 노닐고 있으니 평화롭기 그지없다.
조선시대에 덕양산은 별장 지대로 유명했던 모양이다. 그림에는 별장 세 곳이 나오는데, 맨 왼쪽 절벽 위의 집은 낙건정(樂健亭)이라 불리고, 중간의 큰 별장은 귀래정(歸來亭), 맨 오른쪽은 장밀헌이라고 이름붙인 별장이다. 낙건정 절벽 옆으로 지금은 행주대교가 지나가고 있다. 덕양산 정상 부분은 그림에 없는데, 아마 별장지역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다. 지금은 공항으로 가는 붉은 철교 방화대교가 지나는 곳이다. 아무튼 그림 속 별장의 주인들은 모두 겸재와 잘 아는 사이요, 어쩌면 그들의 부탁으로 이 그림을 그렸을지 모른다. 별장 있던 자리에 지금은 카페들이 들어서 있다.
자연은 역사를 품는가?
흐름이 멈춘 듯한 강물이지만 인간은 흘러간 역사를 기억한다. 덕양산에 있는 행주산성은 백제 때부터 한강을 지키는 요충지였으니 광개토왕과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치기 위해 수군을 이끌고 지나가던 곳이요, 무엇보다도 1593년 임진왜란 때에 조선군이 왜군 삼만 명을 물리친 곳으로 유명하다. 단 하루 동안의 전투에서 권율 장군이 이끄는 3천의 병사로 3만 명과 싸워 이겼으니 대단한 전과이고, 왜군은 이곳 전투의 패배로 서울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후퇴하여 긴 종전협상에 들어간 후에 결국 본국으로 퇴각한다.
그때 이 전투에 참가했던 일본 장수들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고니시 유키나가(소서행장)를 비롯해 쟁쟁한 자들이 많았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으로 조선원정에 나섰다가 패배하여 돌아간 그들은 도요토미가 죽은 직후인 1600년에 벌어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다시 패배함으로써 19세기 말까지 300백 년 동안 이어지는 도쿠가와 막부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 그들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한 것은 행주산성에서 진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니, 행주대첩은 조선의 운명뿐 아니라 일본 역사의 운명을 좌우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교토에서 세키가하라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조선과 일본이 연결되는 역사의 우연과 필연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행주산성을 두고 벌어진 치열했던 전투의 함성소리와 부상자들의 울부짖는 소리,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신음소리는 시간과 함께 사라졌지만 인간의 기억 속에서 재생된다. 비존재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은 개인에게나 민족사로나 중요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억은 어제를 오늘로 만드는 시간의 마술사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집권 세력에 속했던 겸재가 행주대첩을 몰랐을 리 없다. 1895년에 전봉준의 농민군이 일어설 때에 임진년의 원수를 갚겠다고 외쳤고, 임진왜란 때에 왜의 사신 현소는 일본의 조선침공이 원과 연합한 고려군의 일본침공에 대한 복수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후손들이 삼백년 전의 일을 어제 일처럼 기억하는데, 왜란을 겪은 지 불과 백 수 십년 뒤의 겸재에게 감회가 스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미학적인 아름다움으로 역사를 품을 수 있다. 역사를 잊는 게 아니라 승화시켜 품는 것이다. 흐르지 않는 것 같은 강물을 바라보며 순간의 정적을 이어간다. 순간은 길이가 없는 찰라의 시간이니 스토리가 없는 무의 시간 속에서 태초의 원기(元氣)에 가 닿는 것이 아름다움을 담는 그림 작업일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필요 없는 순간의 평화를 이어갈 줄 알 때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갈등의 역사를 대할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겸재가 그린 한강의 풍경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순간과 시간의 왕래와 교감이 그림을 남긴 겸재에게나 감상하는 나에게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이리라.
생각에 잠긴 동안 매미도 울음을 멈추었던가? 갑자기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강변의 모든 매미가 일제히 울어대는 소리가 부드러운 강바람에 실려 리듬을 타고 사방을 울린다.

행호청선(杏湖聽蟬). 행호에서 매미소리를 듣다.
삼각산 흰 암봉들 저 멀리 두고
버느나무 잎사귀 사이로 붉은 다리 보이니
행호라 불렸는가
푸른 덕양산에 묻힌 그날의 함성 잊지 않고
넉넉한 강물
도심 속 호수처럼 멈춘 듯 흐를 때에
무심한 고방오리들
잔잔한 물결 따라 몸을 맡기네
역사 위에 노니는 풍류인가
부드러운 강바람 따라
옛 선비들 별장 있던 기슭 바라보며
요란한 매미 소리를 듣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