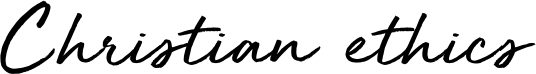종교와 신화의 세계로부터 인문주의 철학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인류의 문명사와 정신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며, 성서와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는 신성모독의 죄로 죽임을 당했다. 그는 신들의 이야기를 멀리했으며, 인간의 구원을 신의 은총에서 찾지 않고 진리를 깨우치는 데에서 찾았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진리란 보편적인 도덕적 이치를 가리키며, 인간의 내면에 들어 있는 이성으로 진리를 알고 실천할 때에 인간은 자유로워지고 공동체가 튼튼해진다고 그들은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의존하기보다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는 데에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안전이 달려 있다고 믿고 가르쳤다. 그러나 올림포스 신에 대한 숭배와 의례가 여전하던 BC 4-5세기의 아테네에 퍼져 나가던 소크라테스의 언행은 지도층에게는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보였다.
고대사회에서 종교와 제의는 국민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모독과 무신론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안보를 위협하는 무서운 죄로 여겨졌다. 사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것도 로마의 전통적 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통해 결집하던 로마의 평화를 기독교인들이 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신상도 없고 신전도 없이 무미건조한 예배를 드리며 보이지 않는 신을 경배하는 기독교인들은 당시의 로마 지도층에게 신성모독이면서 무신론자들로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플라톤이 묘사해 놓은 소크라테스의 죽음 장면을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대목이 있다. 죽기 직전 그의 마지막 유언은 신전에 제물을 바치라는 당부였다. 그는 옆에서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며 있던 제자 크리톤에게 이렇게 말한다.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오스께 닭 한 마리를 빚지고 있네. 잊지 말고 갚게나.”
아스클레오피스는 의술의 신이다. 당시에 그리스인들은 아스클레오피스를 모셔 놓은 신전을 찾아가 제물을 바치고 누워서 자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다. 그런데, 인문주의자 소크라테스가 왜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에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까?
소크라테스가 신을 믿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그는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맞추어 자신의 죽음을 아스클레오피스 신전에서 잠드는 것처럼 말한 것일 수 있다. 아픈 사람들이 신전에서 잠을 자고 깨어나면 병이 낫듯이, 이승에서 육체가 만드는 욕망의 병에 시달리며 진리를 잘 모르고 진리가 주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죽음이라는 잠에 들면 육체 없는 영혼이 깨어나 진리를 밝게 보며 그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식의 생각을 했다면 제자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것 역시 비유적 행위를 부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성모독의 죄로 죽는 마당에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신께 제물을 바치라고 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죽음을 육체의 병이 낫기 위해 신전에서 자는 잠에 비유했는데, 그 비유에 맞추려고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서 제물을 바치라고 한 것 아닐까?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유언이 비유라 할지라도 그 비유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요구했다. 제자는 비유의 말을 그대로 따라해야 했고, 닭을 잡아 신에게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여긴 것 같다. 물론 그의 관심은 신에게 있지 않고 진리에 있다. 그가 제자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신에게 제물을 바쳐달라고 말한 것은 신이 자신을 구원하리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소크라테스는 종교적 신앙이 지니는 절대자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한 태도를 살리려고 했던 것 같다.
인간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 믿음을 통해 신 앞에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해진다. 물론 소크라테스가 볼 때에 이제 인간은 제물을 받고 기도를 들어주는 신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하고, 도덕적 진리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순종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과 세상의 구원이 가능하다. 그래야 참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 아닌 도덕적 진리 앞에서 과연 인간이 경외심을 느끼고 두려워 순종할까? 바로 그 점에 대한 염려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종교적 제의의 형식을 필요로 했던 것 같다. 신에게 귀한 제물을 드리는 형식을 취하면서, 그러나 신이 아닌 마음 속 진리에 충성해야 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신에 관한 담론을 버리지는 않지만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에서 사용했다. 플라톤은 ‘신들에 관한 말’ 곧 신학(theologia)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올림포스 신들과 달리 신은 선하고 정의로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물을 많이 바치는 자를 축복하는 신은 사회에 해롭다고 말하면서 종교의 신의 자리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진리를 앉힌 사람이 플라톤이다. 그 도덕적 진리가 유명한 선의 이데아 곧 이념적 선이다. 이른바 서양 관념론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비슷한 인물이 동아시아의 공자와 맹자이다. 공자는 종교를 벗어난 인문주의자이면서도 종교의례를 중시했다.
공자는 신 대신에 인간을 주제로 삼아 말한 인문주의자이다. 공자의 제자들은 그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그가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하지 않고 상덕치인(常德治人)을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주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공자 시대에 이르러 종교와 신을 주제로 삼지 않고 도덕과 인간을 주제로 삼았음을 가리킨다. 공자는 괴상한 이적 대신에 일상적 삶을 주제로 삼고, 힘 대신에 덕을 주제로 삼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대신에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삼고, 신 대신에 인간을 주제로 삼은 인물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매월 초하루에 지내는 종묘제사에 희생양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인문주의자 공자의 영향일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공자는 자공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는 그 양을 사랑하느냐? 나는 양을 가지고 드리는 그 예를 사랑한다.”(爾愛其羊, 我愛其禮) 양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일을 그만두려는 자공을 향해 공자는 양을 아끼는 것보다 종교의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문주의자인 공자 자신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
공자는 예의 핵심을 인으로 보았다. 인한 마음을 겉으로 대변하는 것이 예절이다(禮節者, 仁之貌也. 歌樂者 仁之和也). 그래서 그는 “사람이 인하지 않으면 예는 해서 무엇하겠는가?”(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라고 말했다. 그런데, 인은 여러가지 덕으로 분화될 수 있으며, 의(義)와 예(禮)와 지(智)도 모두 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예로 분화된 인의 내용은 겸양이다. 사양지심(辭讓之心)의 덕이 예를 이룬다는 맹자의 이론도 공자의 가르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공자가 예를 중요시하며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겸손한 마음이었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에 대한 경외심이야말로 인류가 오랫동안 유지했고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는 겸양의 모습이었다.
공자는 사람들이 신을 섬기며 가졌던 어떤 경외심을 유지하기 바란 것 같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처럼 공자는 옛 종교에서 인문주의 철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인물이다. 그러므로 도덕적 이치인 천리(天理)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렵다. 경외심이란 말을 신에 대해 쓰지 않고 온전히 진리와 도덕적 이치에 대해 사용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했다. 사람들이 점점 합리화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이다. 12세기에 이르러 주희는 신이 아닌 형이상학적 천리에 대한 경외심을 중요한 수양방법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16세기의 왕양명에 이르러 종교와 형이상학을 제거한 채 온전히 마음속 이치의 능력에 집중하여 치양지(致良知)와 심즉리(心卽理)를 말하게 된다. 그러나 종교에서 도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인물인 공자는 제물을 바치며 신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새 시대를 위해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그렇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용으로는 도덕적 이치에 대한 경외심이지만, 신 앞에서 정성을 다하는 형식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인문주의와 종교에 양다리를 걸친 것이요, 인문주의에 중심을 두면서 종교적 의례에도 한 발을 뻗어둔 것이다. 공자가 “조상에게 제사지낼 때에는 조상이 실제로 계시는 것처럼 하고, 신에게 제사지낼 때에는 신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하셨다”(祭如在 祭神如神在)는 기록도 그 점을 보여준다. ‘제사 지낼 때에 신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했다’는 말은 공자가 어떤 절대자를 모시는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다. 그 절대자가 신이 아니고 천(天)이요, 천은 천리(天理)였지만, 공자는 마음을 다하여 공손하게 신을 섬기는 형식을 빌어 인간이 이기심에 빠져 교만해지지 않고 도덕적 이치에 순종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공자가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고 말한 것도 그런 의미로 봐야 한다. 그는 지혜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사람의 도리에 힘쓰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라”(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귀신을 멀리하라.’ 중요한 것은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할 도리일 뿐, 그 존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신을 믿거나 숭배하는 데에 힘을 써서는 안 된다. 인문주의자다운 가르침이다. 그런데, 귀신을 멀리하라는 말 앞에 공경하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신을 경외하는 그 겸손한 태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며, 양심의 명령을 대할 때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을 두려워하듯 해야 한다는 뜻으로 봐야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이면서 동시에 이성이 찾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어 로고스는 말이란 뜻과 보편적 이치 곧 진리라는 뜻을 동시에 가진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이치로 이해하기에 앞서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중립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과 교통하며 삶을 위로하는 은혜의 존재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성서의 하나님은 진리이기도 하다. 그리스어 로고스가 지니는 두 가지 의미가 기독교의 하나님에게 모두 타당하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성서의 신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찾고 깨달을 보편적 진리이기도 함을 말해준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보편 가치로서의 도덕성에 민감하다. 교인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데에는 기독교인은 도덕적으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거룩함이란 도덕성 너머에서 자유롭게 도덕적일 수 있는 정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독교는 칸트 식의 도덕종교가 아니지만 도덕성은 신앙인을 가늠하는 중요한 표지가 된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라는 말에는 은혜가 진리에 앞선다는 뜻도 들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진리에 대한 순종에 앞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속에 도덕적 이치에 대한 순종이 들어 있다. 이기적 존재인 인간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 속에서만 진리의 도덕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른다. 바로 그것이 『고백록』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하는 점이다.
그렇게 보면 소크라테스와 공자가 바라던 바가 기독교 신앙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플라톤은 어디에 도달해야할지 목표를 알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을 몰랐다고 평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은 기독교야말로 인문주의자들이 추구하던 진리를 만나게 해주는 종교임을 뜻한다. 미신적인 자연종교의 시대를 지나 인문주의가 도래했고, 인문주의 후에 도래한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실체를 찾는 여정을 완성한다. 그것은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여정의 완성이기도 하다.
다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말하고 진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크게 마음에 걸린다. 사실 아우구스티누스 전통의 개신교는 은혜를 강조했고, 아퀴나스 전통의 가톨릭은 진리 쪽에 좀 더 주목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면서 은혜를 말하지 않거나, 은혜를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기독교가 아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예수께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물었는데, 오늘날 교회는 진리에 대해 묻지 않는다. 기독교 신앙이 진리와 무관해지고 기독교가 보편 가치와 무관한 종교가 되면, 그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미신이라고 비판한 자연종교가 되고 말텐데 말이다.
성서의 하나님이 진리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간디의 말도 늘 되새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리켜 “은혜와 진리”라고 말한 성서에 충실한 신앙이 될 것이다.
사진: 베를린 시에 세워져 있는 공자 동상. “남이 네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공자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